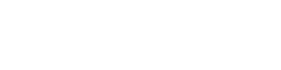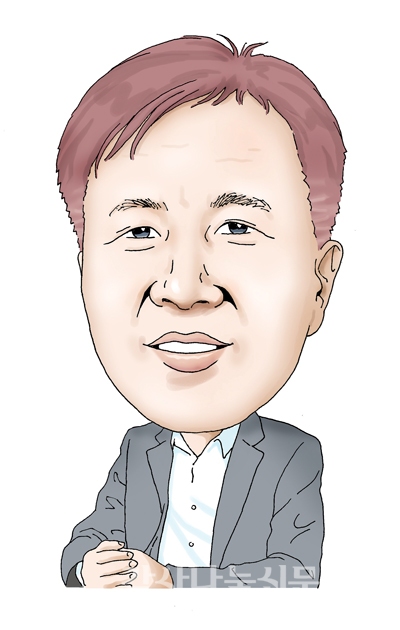
나는 작가 겸 프리랜서 편집자이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 감사나눔신문 기자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붙었다. 이는 단순한 이력 추가가 아니라 삶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변곡점이다.
2013년, 한 출판사로부터 감사 책 편집 의뢰를 받았다. ‘감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다소 뜬금없는 주제에 갸우뚱했지만, 프리랜서가 주어진 일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뜬금없다’는 느낌은 책을 만들어가는 내내 지우기 어려웠다. 세상은 하나의 운동으로 바뀌지 않는 견고한 성(城)이라고 늘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생각에 균열이 간 일이 벌어졌다. 감사 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감사 강의를 들어보기로 했다. 강사가 스마트폰을 꺼내라고 했다. 그러고는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 표현 다섯 가지를 써서 보내라고 했다. 잠시 망설였다. 오래 글을 썼지만 그런 글을 써본 적이 없었다. 난감했지만, 일이라 생각하고 아내에게 감사를 써서 보냈다. 무응답이었다.(집에 가서 물어보니 어떤 상황이냐고 묻기만 했다.)
나는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세상을 곱게 보았을 리가 없다. 민중들에게 고통을 주는 체제의 모순을 깊게 봐야 했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변화를 도모하는 사고에 익숙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작가가 되었다. 작가 또한 세상을 곱게 보지 않는다. 이야기를 짓는 작가의 시선은 늘 세상의 부정적인 요소에 가 있다. 이야기의 원동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완전하고 균형 잡힌 모습에서 어떻게 진전되는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가?
감사와 긍정보다는 비판과 부정을 가까이 하며 사는 내게 잠시 접했던 ‘감사’는 금방 잊혀져갔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감사 책 의뢰가 또 내게 왔다. 나는 분명 당시의 그들처럼 감사 실천을 하지 않고 있었고, 또 그다지 감사에 매력을 느끼지도 않고 있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웬만하면 맡는다는 프리랜서의 원칙을 따랐고, 감사는 또다시 내 사고 안에서 진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일이 끝남과 동시에 나는 감사를 또 잊었다. 살갑게 혹은 친절하게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 나의 행동으로 볼 때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감사가 또 나를 찾아왔다. 감사나눔신문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는 것이었다. 또 프리랜서의 원칙을 지켰고, 감사나눔신문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감사나눔신문에 몸담으면서 서서히 변하는 내 모습에 경천동지했다. 멀리했던 것들이 내 안에 스며들고 있었다. 3번이나 운명처럼 내게 온 ‘감사’, 감사할 따름이다.
김서정 기자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