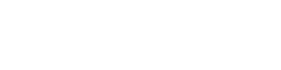10분 독서토론 - 다시 읽어 보는 감사독서 30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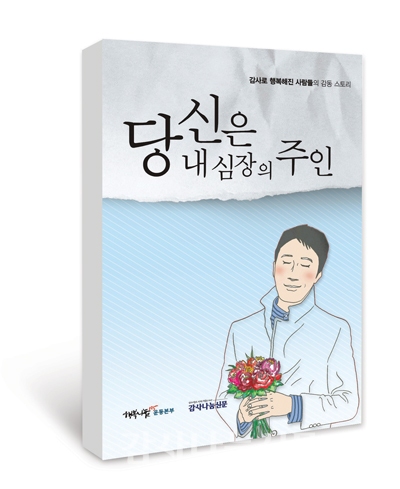
당신은 내 심장의 주인
김현숙 외 10인 공저
감사나눔신문
“야야! 사람은 살며 세상천지 어디를 다 가도, 지서(경찰서)하고 병원은 한 번도 안 가고 사는 게 제일이데이~”
어릴 적, 엄마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난 엄마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셈이다. 매일 우리 부부는 경찰서와 병원을 드나들었으니 말이다. 남편의 직업은 경찰공무원. 그것도 강력반 형사다.
연애 시절, 웃을 때마다 반달이 되는 선량한 두 눈이 좋아서, 그것이 그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언제부턴가 그의 눈꼬리는 위로만 치솟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때의 그 선량한 반달눈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대하는 사람이라고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된 강도에 사기, 절도범 등이니, 이 남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많다는 게 도리어 이상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턴가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남편이 언제 웃었는지 한참을 생각해야 했다.
나의 직업은 간호사, 햇수로 따지면 20년차가 된다. 간호과를 졸업하고 처음 나이팅게일 선서를 할 때의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백의의 천사가 되어야겠다고 호기에 찼던 나의 다짐들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아픈 몸, 참을 수 없는 통증을 줄이고자 병원을 찾는 사람들, 그들 표정에 가득 담긴 신경질과 불만, 그리고 일그러진 얼굴들을 일상으로 대하다보니, 나는 어느 순간부터 전혀 친절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모습, 그저 불친절한 간호사의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나 또한 마치 정해진 수순인 양 그렇게, 환자들처럼… 남편처럼… 전혀 웃을 수 없는 날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어느 새 제 아빠의 키를 넘기며 훌쩍 커버린 아들. 아이는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느라 아주 심하게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는 온순하고 공부도 곧잘 하던 아이라 별 걱정거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 되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둘째 치고, 친구들과 싸움박질 하느라 얼굴 성한 날이 별로 없었다. 퇴근하는 내 품으로 “엄마!” 하며 뛰어와 다정스럽게 안기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열 마디를 물어야 겨우 한두 마디 퉁명스럽게 내뱉는 아들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언제나 화난 표정이었고, 그런 그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다.
아들 또한 그렇게 남편처럼… 나처럼… 웃을 수 없는 날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