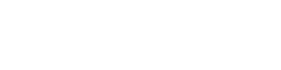곽동언의 마음산책

오래 전 버킷 리스트(bucket list)를 작성한 적이 있다. 단어가 가진 무게 때문에 진지하기도 했지만, 남들처럼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산토리니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순간순간 설레기도 했다. 30여 가지의 버킷 리스트를 채워가는 동안 1순위는 칸을 비워 두었다. 맨 마지막에 적은 버킷 리스트 대망의 1위는 ‘사랑 고백하기’였다.
이미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처지였기에 이성에 대한 사랑 고백은 결코 아니었다. 그 사랑 고백의 대상은 바로 내 어머니였다. 당시 필자는 갓 40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때까지 어머니께 단 한 번도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나를 낳고 키워준 존재,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믿고 응원해 주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런 분에게 난 너무 인색했었다. 가뭄에 콩 나듯 전화 한 통 하고, 명절 때면 의무적으로 귀향 행렬에 동참하는 게 전부였다.
가족끼리는 다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황망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퍼뜩 깨달았다. 아버지께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 표현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부모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다.
첫 번째 버킷 리스트를 실행하는 디데이(D-Day)는 내 생일날로 정했다. 전화를 걸자마자 어머니는 미역국은 먹었냐고 먼저 물으셨다. 순간 목울대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고 올라왔다. 송화기를 손으로 막고 헛기침으로 몇 번이나 목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준비해둔 말을 떠듬떠듬 해나갔다. “엄니, …엄니가 내 엄니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니 아들이라서… 행복합니다.”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려웠다.
한참 만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냐, 고맙다~잉. 나도 니가 내 아들이어서 항시 좋았어야. 고맙다~잉. 감기 안 들게 따뜻하게 입고 댕겨라~잉.” “엄니도요. 엄니… 사랑합니다!”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오래도록 가슴이 먹먹했다. 이 한 마디를 전하는 데 40년의 세월이 걸리다니, 참으로 무던하고 인색한 아들이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가슴에 화롯불 같은 온기가 돌았다.
사랑 고백을 한 후 처음 맞은 명절은 여느 때와 달랐다. 멀리 있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렜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교통체증도 전혀 짜증스럽지 않았다. 열 시간 가까운 운전 끝에 도착한 고향집에서 처음으로 큰절 대신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약속이라도 한 듯 아내와 아이들도 포옹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렇게 다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는 갑작스런 소나기와 함께 먼 길을 떠나셨다. 봄이 오고 꽃이 피어도, 이제는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슬프지만은 않다. 어디에도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임을 알기에. 돌이켜보면 그때의 사랑 고백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였고, 내가 한 최고의 효도였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어두운 밤, 초롱을 들고 골목길을 걷고 있는 장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다. “앞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초롱을 켜고 다니시오?” 그러자 장님이 대답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해 가지요.” 타인을 생각하는 작은 배려도 따지고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하물며 평생 내편이 되어준 부모에게 하는 자식의 알량한 효도 따위는 말해 무엇 할까.
“당신이어서 고맙습니다.”
인디언 세네카 족의 인사말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비껴서면, 작지만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들이 주위에 그득하다. 소중한 것은 항상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무심한 듯 나를 지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당신이어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