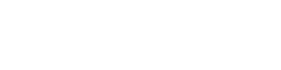영화속 감사 / 벌새(House of Hummingbird, 2018)
과거는 현재의 기억으로부터 재편된다. 그때 그 시절이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진저리가 난다. 그 모습들이 물리적으로 남아 있지 않고 마음속에만 남아 있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다. 지금 상태가 좋다고 해서 그 기억이 아름답지도 않고 지금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그 기억이 고달프지도 않다. 오로지 그 기억과 현재의 마음 상태가 1초에 90번 이상 날갯짓을 하는 벌새보다 더 많이 교감하면서 벌어질 뿐이다. 제주도 봄날 날씨보다 더 변화무쌍하고 변덕스럽다.
아내가 내게 말했다.
“영화에 방앗간이 나와.”
느린 전개 탓에 독립영화는 거의 보지 않는데, 이 말에 이끌려 벌새를 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가래떡을 뽑고, 주인공인 중2 은희를 포함 세 아이들은 가래떡을 펴고 틀에 담는다. 굳은 가래떡은 기계로 썬다. 어머니는 가게 앞에서 떡을 판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피곤한 아버지는 잠을 잔다. 다른 식구들은 꼬깃꼬깃한 지폐를 편다. 내가 스무 살이었던 우리 집 풍경과 판박이다.
공부는 못해도 한문학원은 꼬박 다니는 은희 앞에 좌파 운동권 출신으로 연상되는 학원강사 영지가 나타난다. 그녀가 칠판에 명심보감 한 구절을 쓴다.
“상식만천하 지심능기인(相識滿天下 知心能幾人)”
읽어보라고 하자 은희는 띄엄띄엄 읽는다. 중학교 때 한문을 유독 좋아했던 나는 피식 웃는다. 영지도 슬쩍 웃고는 뜻풀이를 한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능히 몇이나 되겠는가?”
둔기로 한 방 맞은 것 같다. SNS 네트워크에 웃기도 하고 우울해 하기도 하는 내가 슬퍼진다. 그러면서 다독인다. 내 마음도 모르는데 누구 마음을 내 어찌 알겠는가 하고 말이다. 그때 불현듯 아픔이 밀려온다. 운동권 출신인 나도 학원강사로 진출했으면 돈 좀 벌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
1994년의 일상을 보편적으로 담았다는 벌새에 역사적 사건이 등장한다. 성수대교 붕괴는 영화에서 변곡점 역할을 한다. 다가오는 삶들에 죽음이 덧씌워지면서 주인공의 성찰이 깊어진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라는 망자의 말이 부침하는 기억에 눈물을 글썽이게 한다.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살아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 기억들에 감사를 입힌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해준 영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