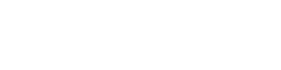30여년 교도관 생활에의 회고(28)

고층 구치시설로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껏 드문드문 드러나는 보안상 위해 요소들을 고쳐 나가며 힘들어하던 차에 마침 맞닥뜨린 IMF의 여파로 수용인원이 점증했을 뿐 아니라, 신입자 중 늘어나는 환자들의 격증이 또한 수용관리를 힘들게 했다. 저마다 어려운 경제난 탓에 고작 수십 만 원의 벌금을 미납하여 환형 유치되어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그들 중 많은 숫자가 중환자에 가깝게 몸이 상해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받을 벌금보다 오히려
외부병원 진료•입원 등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자칫 관리소홀로 수용 중 사망사고라도 빚어질 경우의 그 난감한 뒷감당을 생각하면 치료비용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은 없었다.
따라서 환자사동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자들에게 각별히 지시함은 물론, 특히 신입자의 대조•수용을 담당하는 간부에게는 신원 확인 시 반드시 의무과 숙직 직원을 입회시켜 환자 색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또한 위험 징후가 감지되는 자의 경우 수용을 보류하고, 경찰관 등 호송해 온 자로 하여금 즉시 외부병원 진료부터 받게 한 후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누누이 지시해 오고 있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어느 날 늦은 퇴근에 바쁘게 옷을 갈아입는데 신입자 담당 간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과장님 신입이 왔는데 그중 한 명이 눈빛이 풀려있고 위험해 보입니다.」
「호송 경찰관에게 병원부터 다녀오라고 해. 그렇게 지시했잖아!」
「경찰 호송차가 이미 가버리고 없답니다.」
「그럼 우리 엠블런스 빌려 주도록 해.」
그렇게 해서 환자는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병원 도착 후 한 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이튿날 일개 분대는 됨직한 망자의 가족들이 구치소를 찾아왔다. 경찰관이 망자를 호송해 왔을 때의 상태를 문의하는 듯했다. 아마도 가혹행위의 유무 등을 탐문하고 있었으리라. 부검하면 불필요한 오해들은 쉽게 벗을 수 있겠으나, 당장에 경찰을 향해 있는 저 원망들이 하마터면 우리 것이 될 뻔하여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 씁쓸했던 경험은, 직원들에게는 산교육으로 자리하고도 남을 것이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노라면, 정작 그 사고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중환자가 아무런 배려 없이 송치. 수용되던, 당시의 형사사법제도의 잘못된 관행에서 기인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
그후 몇 달 지나지 않은 날 새벽 2시경에, 잠을 깨우며 당직계장이 전화로 보고해 왔다. 어제 저녁 수용된 신입재소자가 취침 중 각혈을 하고 혈변을 보여 외부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장 파열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 중이라는 것이었다. 이튿날 출근하여 살펴보니, 입원한 신입재소자는 구청 세무과 공무원으로 뇌물죄로 입소했는데, 입소 당시는 몸이 좀 불편한 듯 보였으나 별다른 병증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당사자의 발병 후 신입거실의 모든 재소자에 대해 폭행여부 등을 샅샅이 조사해 보았으나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마음이 찝찝해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는데, 외부병원 계호 근무자로부터 보고전화가 왔다.
「입원한 재소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직원들로부터 복부 쪽을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향후 그 검사와 직원들을 독직폭행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관련되지 아니해 다행으로 여겨졌지만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라 싶어, 입원재소자의 특이동정 및 신입거실 재소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참고사항으로 해당검사실에 통보해 주도록 했다. 그 후 입원했던 재소자는 퇴원하자마자 본인의 다짐대로 담당 검사를 독직폭행죄로 고소하는 만용(?)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자 사건은 엉뚱한 쪽으로 파급되어 소란을 떨었다. 당사자인 K검사는 차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피고소인이 된 사실 자체에 지나치게 흥분하여 설치니, 그 움직임이 치졸•황당하며 금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날 이후 당시 신입자 거실에 있었던 재소자는 물론, 애꿎은 근무 직원들까지 모두 불러 재소자의 장 파열에 대한 혐의를 추궁.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불가능한 희망을 떼쓰는 듯한 그 졸렬함과 추태가 보기에 참 힘이 들었다.
그러나 논점을 흐트려버린 검사의 부지런함 탓에 그 고소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져 은연중에 잊혀지고, 다친 사람만 감히 검사를 고소한 괘씸죄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떨구는 것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 공무원은 형을 받은 뒤 이송되면서 「그냥 아프고 말걸 괜히 검사를 건드렸다」며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고 했다. 길어야 이 삼년이면 족할 죄질에 괘씸죄가 덧붙여져 무려 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니 그 처지가 과연 딱했고, 검사의 분노에 동승한 판사의 용맹은 또 무엇인지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세상의 밝기가 아직은 부족했던 시절 탓이었겠지만, 그러나 외자를 쓰는 K검사의 그 이름만은 내 삶에 기억해 두고 그 장래를 지켜보고자 마음먹었었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검사로서의 그의 이름이 그리 오래 남지는 못했었다.
이태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현 사단법인 대한민국 재향 교정동우회 회장)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