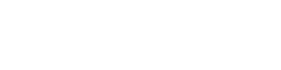곽동언의 마음산책

입춘을 전후로 거짓말처럼 포근한 날씨가 찾아 왔다. 두 달여 동안 사흘이 멀다 하고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잊을 만하면 함박눈이 쏟아지더니, 하루아침에 봄 속으로 풍덩,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 같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추위가 사라진 자리엔 금세 부연 미세먼지가 똬리를 틀고 앉았다.
3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완화됐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두꺼운 마스크를 쓰고 무표정하게 거리를 지나간다. 괜스레 우울해지고 쓸쓸해지는 2월 초순의 풍경이다.
조금 늑장을 부려도 좋을 휴일, 새벽부터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 여행을 떠나는 막내를 공항까지 배웅해주기 위해서였다. 아들을 내려주고 다시 동네로 돌아올 때까지도 골목의 어둠은 채 걷히지 않았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망설이다가 나온 김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기로 한다. 보통은 뒷산 자락길을 걷곤 하는데,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재래시장 입구에 발길이 닿아 있다. 여섯 시를 갓 넘은 시간이라서 시장은 인적 없이 고요하다.
골목 양쪽으로 늘어선 70여 개의 점포는 대부분 셔터를 내리고 있고, 점포 앞 좌판은 파란 포장을 이불 삼아 긴 잠에 빠져 있다. ㄱ자로 꺾이는 곳에서 방향을 틀자 환하게 불을 켠 점포가 눈에 들어온다. 두부 가게와 떡집이다. 오늘 어느 집에 잔치라도 있는 모양이다.
떡집의 여사장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팥 시루떡을 먹기 편하게 자르고 보기 좋게 포장하느라 잠시도 손을 멈추지 않는다. 그녀의 바쁜 손놀림에 시장 골목의 어둠도 서서히 걷혀간다.
바람이 분다.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엔 시장에 간다. 부연 하늘이 내려앉고 스산한 바람이 마음을 흔들 때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재래시장으로 향한다. 재래시장엔 문턱도 없고 출입문도 없다. 언제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그때마다 고향처럼 푸근하고 정겨운 표정으로 맞아 준다.
재래시장엔 수많은 꿈이 있고, 뜨거운 땀과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과 따뜻한 정이 있다. 일출보다 먼저 아침을 여는 상인들의 바쁜 손끝에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꿈이 서려 있고, 한낮 유쾌한 흥정으로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에는 상인들의 치열한 땀방울이 송글송글 꽃망울처럼 맺힌다.
또, 시장 골목을 오가는 손님들의 어깨마다 들썩들썩 흥이 넘쳐나고, 해가 지면 발갛게 불을 밝히는 백열전구처럼 따듯한 정이 흐른다. 여기저기서 ‘떨이’를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단골들의 장바구니엔 눈처럼 소복소복 ‘덤’이 쌓여 간다.
스산한 바람이 불고 마음도 싱숭생숭 바람 따라 흔들릴 때, 이유 없이 외롭고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까운 재래시장을 가 보자. 시장은 언제나 호객행위와 흥정으로 왁자지껄 활력이 넘치고, 음식 냄새보다 강한 사람 사는 냄새로 진동한다.
어깨를 부딪치며 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내 몸 어딘가에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꿈틀거리는 삶의 의지가 돋아나는 걸 느낄 수 있다. 시장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서서히 충전되는 것이다.
따끈한 팥 시루떡 한 팩을 사 들고 집으로 향하면서 나도 모르게 시 한 소절을 읊조리게 된다. 정기상 시인의 시 <삶이 허기질 때>이다.
삶이 허기질 땐/ 재래시장 골목길을/ 저물도록 서성거려 보자./ 허기진 삶이/ 한바탕 웃음으로 채워질 테니/
손에 든 봉지의 무게만큼, 아직 식지 않은 시루떡의 온기만큼 감사의 마음이 차오른다.
<작가>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