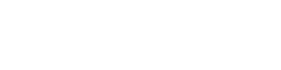30여년 교도관 생활에의 회고

2005년 7월 영등포구치소장으로 전보발령이 났다. 오래전에 지나쳐 온 장소인지라 마음을 추스르며 회고하자니, 숨어 있던 지난 시간의 조각들 중 몇몇이 문득 눈을 떠 썩소를 짓게 했다.
교정간부가 되어 밀고 온 세월의 수레바퀴가 이미 28년을 가리키고, 첫 승진의 기쁨을 안고 영등포구치소를 떠나온 해가 1985년 이니, 그간의 스무 해에 채워지고 곰삭은 연륜만으로도 마음의 득도는 어지간할 것이련만, 시간과 기억에 대한 독특한 사유와 감응으로만 걸러져 잊힘을 거부하는 것들은 따로 또 있었다. 마치 오래 묵은 동통의 질료처럼, 딱지를 떼지 못한 흉터처럼.
「삶은/ 누구나 다 미처 다 읽지 못한 아픔의 책 한권씩을 갖고 있는 거」라던 어느 시인의 말이 생각났다.
1983년 가을 비가 몹시도 내리던 날, 집안 어르신 한 분이 구치소로 찾아왔었다. 보안과에 근무할 때라 민간인을 담 안으로 들일 수도 없고 하여 바깥 청사에 들렸으나, 붐비는 사람들 틈에 내밀한 얘기를 나눌 수도 없어, 청사를 나와 명적과 창고의 작은 지붕 밑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비를 피하며 대담을 나눌 수 있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집안 어른을 어렵게 위무하여 배웅하고 나니 민망한 마음에 식은땀이 절로 났다. 도대체 그렇게 수 없이 건의했었건만, 직원 면회실 하나 만들어 놓을 줄 모르는 조직의 꼬락서니에 욕지거리가 절로 나왔었다.
그러나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들만이 욕먹을 일은 아니었다. 물경 20년이라는 시대와 세대의 간극에도 그 꼬락서니와 욕지거리는 지속되고 있었었다. 영등포구치소장으로 부임해 보니 청사 어디에도 직원면회실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얼마나 많은 욕지거리들이 무심한 자들의 발자국에 밟히며 비명해 왔을지 가히 짐작할 만 했다.
20여 년 전 집안 어른과 함께 비를 피했던 명적과 창고 지붕 밑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나는 관계과장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명적과 창고를 비워 바로 그 자리에 직원면회실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멋진 가구들과 음료수 자판기, T.V 등을 비치하여 구색을 갖추고 면회실이 문을 여니, 비록 늦었지만 직원들이 좋아했다. 더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쌓아두는데 까지 내 순번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1984년 5월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다. 직원식당에 들렸더니 음식의 조리행태가 가관이었다. 직원들의 식판에 담긴 계란 후라이들이 하나같이 식어 굳어져 있으니 모두들 얼굴을 찌푸렸다.
계란 후라이라면 즉석에서 만들어 배식함이 상례이거늘, 그게 귀찮아 부침개 붙이 듯 미리 만들어 차갑고 딱딱하기 까지 한 것을, 밤 새워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내어 놓는 그 심사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다. 담당 여직원을 불러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음식을 조리 하느냐고 나무랐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놀라웠다.
「주임님! 맛있는 것은 댁에서 잡수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드시지요.」
당시의 당직간부라면 그 여직원의 입장에서는 하늘같은 상관이었거늘, 누가 버릇을 그렇게 들인 것인지 거침없는 대꾸가 정녕 놀라웠다.
나는 식사를 그만두고 사무실로 가서 직원식당 담당 여직원을 불렀다. 불려온 여직원이 그제야 긴장한 듯 고개를 떨구었으나 나는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 봐 김 교도! 날 더러 맛있는 건 집에서나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집에서 뭘 먹든 그건 자네의 관심영역이 아니야. 자네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밤새 고생하는 동료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의 조리이고, 그것을 감독하는 일이야. 대체 어느 교도소 식당에서 그 따위로 식어빠진 계란 후라이를 배식하던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말 느끼지 못 하겠어!」
내 목소리는 천장을 뚫을 듯했고, 김 교도는 하얗게 질려 잘못을 빌었다. 그날 이후 계란 후라이는 부드럽고 따뜻해졌었다.
소장 부임 후 직원식당을 찾았더니 계란 후라이는 여전히 따뜻하고 맛있게 조리되고 있었다.
1985년 민원실장 겸 접견영치주임으로 근무할 때 참 많은 민원인들을 만났었다. 저마다 마음에 품은 고충과 딱한 사정들이 많았으니, 사안에 따라서는 그들이 부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서 특별면회를 주선해 주고 싶었던 상황에도 직면했으나 가슴앓이만 했을 뿐, 소장실의 문턱이 워낙 높아 쉽게 찾지 못했었다.
그래서 내가 소장이 된 이후 부임한 교정시설에서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2005년 7월 영등포구치소장으로 부임하고서도 첫 조회에서 직원들에게 말했다.
「교정시설의 주인공은 직원 여러분들입니다. 교정시설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은 물론, 구속되어 사동에서 생활하는 모든 재소자들까지 바로 여러분을 보며 교도관의 이미지를 가슴에 담게 됩니다. 따라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수용처우에 임할 것이며, 수용 관리 중 여러분이 관찰하여 특별면회 등 특단의 개별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탄없이 찾아 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 후 몇 명의 직원이 찾아 왔었고, 특별한 배려들을 허용했었다. 대저 우리들의 기억이란 아픔이 남긴 흔적이기 십상일 터, 내 작은 발걸음이나마 그 동통과 상처의 딱지들을 조금이라도 줄여, 뒤에 오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쉽도록 배려함에 그 뜻을 둘 뿐이겠다
이태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현 대한민국 재향 교정동우회 회장)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