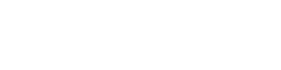곽동언의 마음산책

얼마 전, 공공 기관의 평가위원 자격으로 공모전 심사를 나가게 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일이어서 그리 급할 게 없었지만, 초행길이라서 괜히 마음이 조급했다. 예정시간보다 30분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섰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지하철은 제법 한산했다.
빈자리에 앉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네 명이 그룹으로 묶인 단체방에 한 친구가 인사를 남겼다.
/곽 작가, 사무실인가?//아니, 오늘 심사 볼 일이 생겨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중.//고뢰? 심사비 들어오겠네.//그렇지, 뭐.//심사비로 맛있는 점심이나 먹으러 가세.//어쩌나, 오늘은 선약이 있는데.//그럼 내일 점심으로 하면 되지.//뭐, 그러든지.//그럼 내일 뭉쳐보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대충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30분쯤 지나서 다시 휴대전화가 울리고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광주에 사는 친구가 KTX 왕복 승차권을 예매해서 사진으로 올린 것이었다. 순간 전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일이 커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웬 기차표여?//내일 다 같이 점심 먹자며? 그래서 바로~ 기차표 예매한 거지.//내일이 주말도 아닌데 일은 어쩌고?//일이야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지, 뭔 걱정인가?/
정말 럭비공 같은 친구다.
다음날, 서둘러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 회동을 제안했던 친구와 함께 광명역으로 마중을 나갔다. 한 친구는 전날 야간 근무를 해서 참석하지 못했다. 기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광주 친구는 개구쟁이 같은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다.
/오랜만에 서울 왔는데 뭘 하고 싶은가?//말하면 다 들어주나?/당연히 그래야지!/그럼 우선 팥칼국수부터 먹고 스크린골프 한게임 하러 가세.//좋아, 그렇게 하세!/
동네 식당에서 팥칼국수를 먹고, 가까운 스크린골프장으로 향했다. 평일 대낮에 중년의 사내 셋이 동네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게 영 어색했지만, 그래도 마냥 즐겁기만 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웃음이 터져 나오고 괜한 몸싸움으로 서로 장난을 걸기도 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십 대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저녁 식사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곁들였다.
/오늘 밤엔 뭘 할까?//친구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봐야지.//내 흔적?//말로만 들었던 자네 집 뒷산 생태공원도 직관해보고 밤마다 걷기 운동한다는 자락길도 한번 걸어봐야지.//좋아. 그럼 마지막 잔 비우고 일어나세./
어둑해진 생태공원은 여전히 개구리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친구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연신 탄성을 자아냈다.
내친김에 숲속 자락길을 몇 바퀴 돌고 나서 공원 앞 편의점에 설치된 파라솔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산들산들 바람이 손등을 간질이고 진한 밤꽃향이 코끝을 스쳐 지나갔다.
그곳에서 막걸리 두 병을 비우며 자정까지 수다를 떨었다. 일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는 자식 이야기로 이어졌고, 학창시절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벌써 자정이네. 그만 일어나서 우리 집으로 가세.//그래도 돼?//그럼, 30년 만의 일탈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집에 가서 더 놀다가 피곤해지면 눈 좀 붙이자고./
그렇게 집으로 이동해서 거실에 자리를 깔고 누운 채로 한참을 떠들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느지막이 일어나서 갓 구운 호박 고구마와 커피로 아침을 때운 후 두 시간 가까이 숲길을 걸었고, 숲속 식당에서 누룽지 백숙을 먹는 것으로 1박 2일간의 일탈을 마무리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일탈의 시간은 달콤하고 짜릿했다. 50대 중반에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그 시간을 함께한 친구들이 있어서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다. 기차역까지 친구를 배웅하며, 10년 후 또 한 번 일탈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약속했다.
<작가>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