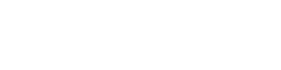곽동언의 마음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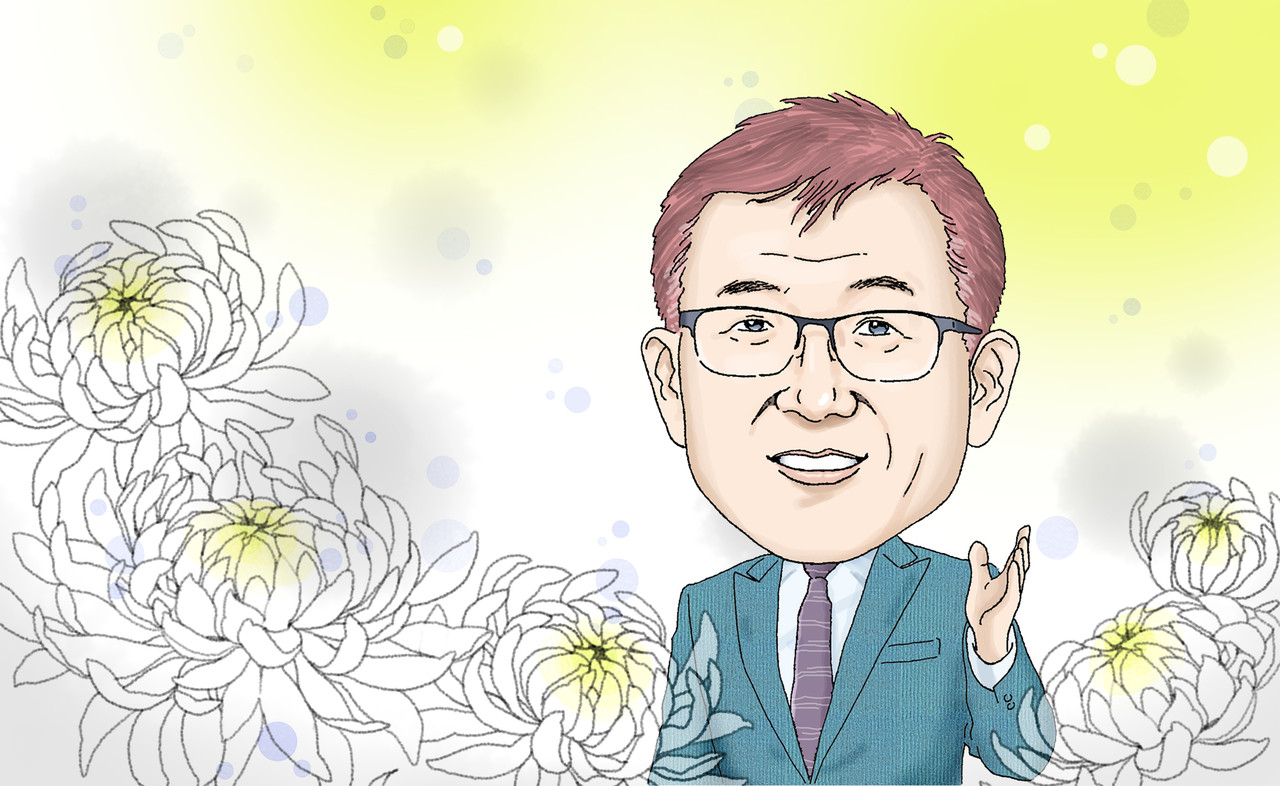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째 폭우가 쏟아지더니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기 무섭게 이번에는 불볕더위가 찾아왔다. 불볕더위는 혼자 오지 않고 홍위병처럼 매미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아침마다 햇살보다 뜨거운 매미 울음소리가 지축을 흔들어 깨운다. 장마에 지친 것일까, 다가올 폭염이 두려운 것일까. 매미 울음소리가 처연하다 못해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들린다.
땅속에서 7년간의 긴 기다림을 뚫고 나와 2주간의 짧은 바깥 생활로 일생을 마감해야 하는 매미가 이토록 절박하게 울어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1년 중 지금 이 순간, 장마와 폭염 사이가 가장 중요한 때임을 알리는 경고는 아닐까.
장마와 폭염 사이에 예기치 못한 비보悲報와 부고訃告가 연이어 날아든다. 형제처럼 지내던 동네 형이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는 비보를 전해 왔고, 한 친구는 아내가 혈액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또 명절 때 가끔 고향에서 마주치던 중학교 동창은 이제 갓 성인이 된 딸아이의 부고를 전해왔다. 스무 살, 이제 한창 꽃피울 나이인데 이 무슨 변고인가 싶고, 이럴 땐 어떤 말로 위로를 전할 수 있을지, 그저 가슴이 먹먹하기만 했다.
그리고 지난주, 또 하나의 충격적인 부고가 날아왔다. 바로 <감사나눔신문> 김용환 대표의 사망 소식이었다. 카톡으로 날아온 부고를 접하고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 곧바로 부고를 보내온 편집국장께 전화를 걸었다.
부디 만우절의 해프닝 같은 사건이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김 대표는 그날 피곤하다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쪽잠을 청했다는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정말 황망하다는 말 외에 그 어떤 말로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고인故人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가을이었다. 10여 년간 연하장 대신 사용하는 ‘연하 도서’를 출간하고 있던 나는, 우연히 그중 한 권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며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다.
낯선 이에게 걸려온 전화여서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감 넘치는 음성과 특유의 친절함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이 생겼고 그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감색 양복을 걸치고 사무실을 찾아온 그는 조금 왜소해 보였지만 당당한 모습이었고, 온몸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졌다.
특히 신문을 보여주며 30여 분간 ‘감사 나눔 캠페인’에 대해 설명할 때는 30대 청년 같은 열정이 느껴지기도 했다. 솔직히 그 열정이 부러웠고, 왠지 그와 함께하면 나 역시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는 일에 티끌만큼이라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은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칼럼 연재 청탁을 받아들였고, 1년만 진행해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벌써 만 3년을 넘어가고 있다.
그 3년 동안 고인은 항상 나보다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로 끝인사를 하곤 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칼럼 연재가 100회에 도달하는 날 자축의 의미로 그와 멋진 만찬을 즐겨보기로 말이다. 하지만 무심한 세월은 그날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는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버렸다.
이번 장마와 폭염이 어느 해보다 길고 힘들게 느껴진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고인을 기억할 것 같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와 폭염 사이에서, 늦었지만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작가>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