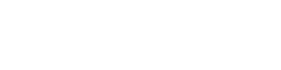정신과 영혼을 멀리 높이
“지금 여러분은 육신이 이곳에 묶여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정신, 영혼마저 묶인 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멀리, 높이 날아보시기 바랍니다.”
제2회 전국 교정시설 감사나눔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상주교도소 김00님의 소감문 첫 페이지에 있는 글이다. 읽는 순간 인용문이라고 알아챘는데, 뜻밖에도 ‘상주교도소 제2작업장 담당 김성진 계장님 말씀 중에서’라는 출처가 보인다. 보통 성인의 말씀이나 유명 문구를 인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펴나가곤 하는데 김00님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조언을 해주는 분의 말이 깊게 와닿았던 것 같다.
육신은 교도소에 있어도 정신과 영혼까지 교도소에 갇혀 있지 않다는 말, 정말 가능할까? 심신이원론으로 보면 가능하고 심신일원론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두 이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신과 영혼을 ‘멀리, 높이’ 날리는 방법이 있다. 바로 글쓰기이다. 문학 작품이든 에세이든 일기든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인 글쓰기는 몸에 깃들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활짝 열어젖혀 유형무형의 곳곳을 넘나들게 하는 마법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 무의식에는 잊힌 과거의 삶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이루는 단어들이 심연 속 과거를 두레박처럼 길어 올린다. 까마득했던 과거가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진 것에 당황하지만, 그건 곧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다짐하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 그런 글쓰기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면 떠올리기 싫은 그때 그 일들도, 아프기만 했던 그때 그 일들도, 새롭게 재편이 되면서 정신의 영역을 확장시켜준다. 즉 육신은 그대로이지만 넓어진 정신과 영혼이 현재의 공간을 재해석하면서 전과 다른 풍요로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묵직한 무언가가 꿈틀거려
“처음에 펜을 들었을 때는 우선 가족에 대해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한 줄 한 줄.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항이 늘어날수록 제 안의 묵직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늘 감사한 분이지요. 아버지? 물론 당연히 감사한 분이구요. 이렇게 그저 익숙한 공기처럼 느끼고 있던 제 가족들, 그리고 제 곁에 계셔 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씩 시간을 더듬고 기억을 떠올려 써내려 가는데 마치 용암이 끓어오르듯, 저의 지난 삶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00님의 소감문 일부이다. 만일 감사 쓰기를 하지 않고 이따금 떠오르는 대로 생각만 했다면 지나온 삶의 흔적들이 영사기 돌리듯 생생하기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은 바람처럼 흘러 사라지지만 글쓰기는 생각을 압축시킨 글자가 종이에 선명히 남아 현재의 나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에 있던 기억들이 살아나면서 ‘묵직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김00님의 말은 옳다. 우리의 기억은 분자 단위의 세포에 새겨져 있다는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연탄과 어머니
감사 쓰기로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나서 김00님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절절히 깨달으며 속죄와 반성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채로웠던 건 김00님이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감사 항목별 글쓰기가 아니라 한 편의 긴 글로 남겼다는 것이었다. 제목은 <연탄과 어머니>였고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51년 전, 그러니까 1972년 겨울은 열한 살이던 내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었다.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스며들 때면 상처로도 추억으로도 그리움으로도 떠오르는 그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요약한 문장에서 김승옥 작가의 <서울 1964년 겨울> 첫 문장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이 떠올랐다. 즉 좋은 단편소설의 느낌이 난 김00님의 글은 1972년에 겪었던 일들을 구체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써내려가고 있었다.
압축해서 보면, 여름방학이 시작된 날 집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가구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도 김00님은 어머니의 말대로 방학숙제를 했다. 빨간 종이가 붙은 책상이 아닌 방바닥에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들은 판잣집 달동네로 이사를 했고, 가난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성공하고 나서 집에 들어온다며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로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짜장면 아니고 김치국밥
늘 어머니를 피해 다니다가 어머니를 마주하게 된 그 어느 날, 김00님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예순 하나의 나이에도 목이 메이는 일을 겪게 된다.
“초겨울 찬바람에도 아무런 바람 가림막도 없이 쌓여진 채소 앞에서 연탄 화력에 얹어진 낡은 냄비 속 김치국밥을 뜨고 있던 엄마. 한 술 뜨기가 무섭게 지나가는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 급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아 또 한 숟갈을 뜨는 엄마의 한 끼가 그때 왜 그렇게 내 눈에 아프게 박혀 왔는지…”
어머니 눈에 띈 김00님은 어머니가 먹으라는 짜장면 대신 김치국밥을 먹은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쏙 빼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을 남긴다.
“그토록 좋아했던 짜장면이었지만 난 그날 엄마가 드시던 김치국밥을 눈물 속에 먹고 또 먹었다. 그 부끄러움은 내 부끄러움의 눈물이었고, 엄마 그리고 김치국밥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연탄으로 출발한 김00님의 1972년 겨울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는 글을 통해 다짐한다. “어머니가 드시던 김치국밥에 울고, 집 한켠 쌓이던 연탄에 기뻐하고, 어머니가 넘어지실까봐 걱정되어 펑펑 내리는 눈을 쓸고 또 쓸던 그해 1972년 겨울의 기억과 추억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 한” 김00님은 그의 말처럼 살 것이다.
“비록 삶의 부침 속에 욕심과 못난 죄로 이곳에 있지만, 이렇게 내안에 51년 전의 겨울이 따뜻이 살아있는 한, 나는 반드시 순리와 정도를 거스르지 않고 살던 ‘나’를 찾을 수 있으리라.”
2013년 고인이 된 김00님의 어머니, 감사 쓰기가 아니었으면 이토록 생생하게 그때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을까? 그때 그 기억이 김00님의 정신과 영혼을 멀리 높이 띄워 그의 다짐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할 것이다. 기억을 기록한 묵직한 글이 영원히 가슴 속에 남아 있기에.
김서정 기자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