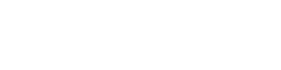30여년 교도관 생활에의 회고

교도소의 밤을 밝히는 감시대의 불빛은
세상의 길을 열고 비추어 주는
등대로서의 역할 또한 자임해 나갈 수 있기를
2009년 봄, 민 선배가 또 책을 부쳐왔다. 김 모교수가 저술한 ‘피해자 학’이었다. ‘형사학의 선구자’ 등 자신이 저술한 책도 이미 여러 권 보내왔었거늘, 그 열정과 후배를 위한 마음 씀을 넙죽넙죽 받기만 하기가 다만 민망할 따름이었다.
그는 몇 안 되는 교정간부 출신 변호사였다. 1950년 6.25 동란의 격동기에 약관 스물의 나이로 교정간부로 임관되어 2년 6개월여 근무한 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검사가 되었다. 그 후 성남. 의정부지청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편, 한국 ‘피해자학회’의 회장을 맡아 동회를 이끌고 있었다.
그 선배의 행보는 남달라, 법조인대관 등 그의 이력이 적시되는 곳이라면 언제나 그 이력의 맨 앞에 빠짐없이 안동교도소 간수장보(지금의 교위)라는 교정간부 경력을 자랑처럼 당당하게 내세워 온 사나이였다. 멋있게 늙어가는 사나이의 전형인 듯 다가드니 많은 후배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해마지 않았었다.
그러나 귀동냥으로 마음에만 담아왔던 그 선배를 직접 대면하는 값진 기회는 2001년 대구구치소장으로 근무할 때 우연히 주어졌다. 당시 웬 초청장을 받고 보니, 경북대학교에서 한국 피해자학회 주관 하에 국제형사학 심포지엄이 열린다는 통보였다.
민 선배의 지엄한 부름에 다름없는 것일 지라 참석했더니 학술 심포지엄은 생각 외로 거창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의 저명한 학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범죄와 피해자 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들이 이어졌다.
특히 독일 ‘형법교과서’와 ‘형법체계에 있어서의 형사정책’ 등 수 많은 저서와 논문을 통해 우리의 형법과 형사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독일 뮌헨대학의 클라우드 록신 교수가 참석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우스웠던 것은, 회의 시작 전에 교정기관장의 참석에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는 사회자의 갑작스런 멘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 깍듯이 인사까지 했던 터라, 모임이 파할 때까지 꼼짝없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고, 그 덕분에 희미하게나마 피해자학의 개념 정도는 덤으로 머리에
담아올 수 있었던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기꺼움은 존경하던 민 선배를 대면하여 인사드리고, 그와 더불어 지난 세월 행형의 발자국과 오늘날의 변화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데서 주어졌다. 마치 군불을 지피듯 그 시간은 은근하여, 초면이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었다.
또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와 수고에 의해 찾아진 삶을 다만 기꺼워하는, 그 선배의 의연함을 엿볼 수 있어 그 만남은 더욱 기뻤다.
그날 이후 그 선배를 마지막으로 만난 때는, 내가 교정본부장을 끝으로 32년의 세월을 묻은 교정현장을 떠나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2010년 늦은 가을이었다.
당시 본부장으로서의 임기끝 무렵에, 재직 중 일간지 등에 기고하였던 시론 및 수필 등을 모아 “등대와 감시대”라는 제호로 책을 발간하였었는데, 그 한 페이지에 자랑스런 민 선배의 삶과 또한 그와의 만남이 당연히 언급되었고, 선배에게도 그 책을 보내 드렸었다.
이후 졸저의 판매 수익금 전부를 도움이 필요한 출소자 10명에게 갱생의 격려금으로 나누어 주었었는데, 부끄럽게도 몇몇 신문에 그 사실이 미담으로 보도되더니 문득 민선배로부터 한 번 만나자는 연락이 오기에 이른 것이었다.
민 선배와 마주한 식사 자리에는 일본에서 온 교수를 비롯, 몇몇 형사학 전공 교수들이 합석하여 술잔과 한담을 같이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졸저에 대한 민 선배의 치켜세움은 지나친 듯해 마냥 민망할 따름이었다.
또한 당시 민 선배와 함께 와 동석한 교수들이 내 책의 제호(등대와 감시대) 가 내포한 의미가 몹시도 궁금한 듯 설명을 재촉해와 말해 주었다.
교도소의 밤을 밝히는 감시대의 불빛은 언뜻 보기에 시설 내외의 빈틈과 허물을 감시, 추적하는 기능으로만 비춰질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기실은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싶지 아니하는 재소자들의 구원을 쫒는 함성이요 비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점멸의 언어가 종래에는 출소자들에게 다시금 발디딤 할 세상의 길을 열고 비추어 주는 등대로서의 역할 또한 자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 본 제호라고 했다.
그러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의미 부여에 동의하는 듯한 표정들이어서 마음이 흡족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과 씨름하고 타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자랑스럽고 후회 없을 인생인지를 넌지시 일러주는 듯 했던 민선배의 따뜻한 미소를 기억한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문득문득 민 선배의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립다.
이태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현 사단법인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 회장)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