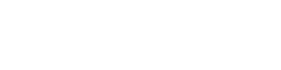글의 향기

오늘날처럼 우리 사회에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난 적이 있었을까. 아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적이 있기나 하였을까. 우리는 드라마나 노래 가사 주제의 대부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아도 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속삭이기도 하는 사랑은, 하나의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폭풍우처럼 몰아칠 때는 격정에 휩쓸려 들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격정에 온몸을 불사르기도 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바람은 밖에서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에서부터 불어온다고 할 수 있다.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자신이며, 잠재우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가는 바람 따라 훅 가버리고 말 수가 있다. 엉뚱한 곳에 툭 떨어지고 말 수도 있다.
바람은 원래부터 유혹하는 성정이 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부추기는 성질이 있다. 틈나면 바람이 불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느냐며 바람 한번 피워보자고 끝없이 우리를 꼬드기려 한다. 그 꼬드김에 넘어가 바람을 몰고 다니다, 맞바람을 만나면 회오리가 될 수도 있다. 정신도 차리지 못하는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
사랑의 감정은 시시각각 바뀌게 마련이다. 자신의, 사랑의 감정이 바람처럼 일어났다 바람처럼 사라지듯, 상대방 사랑의 감정도 이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그리움이나 미움의 감정이 떡하니 자리 잡고 만다. 사랑이라는 애愛가 그리움의 연戀이나 미움의 증憎으로 한순간에 변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사랑의 감정에 애걸복걸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흔히 본다.
바람은 단지 우리가 다스려져야 할 대상일 뿐이다. 억지로 부추길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일으키기를, 아니 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는 없다. 이는 바람에 편승하여 잠시 우리를 유혹하다 스쳐 지나고 말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불립문자不立文字라 보아야 한다. 문자 저 너머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라 부르는 것이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우리, 질질 끌려다녀서야 어디 될 말인가. 우리의 사랑은 너무 다가가거나 너무 멀리 두어서는 안 되는, 반쯤의 사랑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들 사랑이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크다. 태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 멋모르고 사랑의 감정에 휩쓸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도 먼저, 사랑보다 큰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 다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제의 세상과는 또 다른 탁 트인 세상이,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질 것이리라 믿는다.
노희석 (시인.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