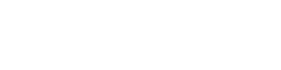알콩달콩 삶의 향기
알콩달콩 삶의 향기
인제 또 와 지겠나
“울 언니는 평생, 좋은 옷 하나 못 입고 좋은 신 한번 못 신고 지지리 고생만 했는데….”
지지리 고생만 한 언니를 두고 오며 뒷자리에 앉아 내내 눈물을 닦아내는 엄마의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다.
본인도 과히 편하게 산 팔자가 아니면서 자신보다 더 고되고 모진 삶을 산 언니가 엄마는 그저 아픈 것이리라.
“너희 이모가 요양병원에 있다는데….”
휴일 아침부터 딸에게 전화를 건 엄마는 차마 그 뒷말을 잇지 못하고 남의 일인 듯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언니에게 가보고 싶으니 데려다 달라는 말을 에두르며 “죽어서나 보겠나!”고 하셨다.
천리만리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한 시간 반 거리, 귀찮은 맘을 억누르고 나에게는 이모, 엄마에게는 언니인 여인을 함께 보러 나섰다.
그리고 도착한 부산의 한 요양병원, 베지밀 한 통 손에 들고 이모가 계신다는 병실 앞에 이르자 크레졸 냄새로도 지워지지 않는 지린내가 진동하며 우리를 먼저 맞았다.
급한 마음에 엄마가 앞서 문을 열자, 가장자리 침대에 웅크린 채 누워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수년 만에 보지만 틀림없는 이모의 형상이었다.
엄마가 다가가 어깨를 흔들며 “언니!”를 불렀다. 눈을 뜨고 고개를 든 이모는 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자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다행히 이모는 아직 동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니는 와이래 늙었노?”
일흔을 넘긴 동생의 쪼글쪼글한 얼굴이 여든을 넘긴 언니의 눈에는 더 아팠던 것이다.
“고생 그만하고 올 여름에는 고추 따러 가지 마래이.”
평생 소처럼 일만하는 동생 생각이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도 뇌리에 박혔던지 엄마를 보며 내내 이 말만 되풀이했다.
긴 그리움에 비해 너무도 짧은 만남의 시간이 지나고 손을 흔드는 언니를 홀로 두고 엄마는 “또 오께” 하며 병실을 나섰다.
이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자 엄마는 “인제 또 와 지겠나, 죽어서야 오겠지” 하시며 긴 한숨을 뱉었다.
이 밤, 아마도 나의 엄마는 혼자 두고 온 언니가 눈에 밟혀 이리저리 몸만 뒤척일 것이다. 제 사는 데 바빠, 제 자식 키우는 데 진이 빠져 하나뿐인 언니, 죽도록 고생만 한 언니에게 더 마음 쓰지 못하고 더 많이 보지 못한 채 지낸 시간이 서럽고도 억울해 눈물만 흘리고 계실 것이다.
아이인 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인 이모와 엄마가 아이인 것 같은 요즈음, 죽어서야 보는 존재가 아니라 살았을 때 더 많이 보여드리며 외롭지 않게 그립지 않게 해드려야겠다.
오늘은 초라한 모습으로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딸이자 언니, 동생이었던, 심란한 시대 고단한 삶을 살아온 내 이모와 같은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곳입니다. 원고와 얼굴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춘선 기자(good@happy125.co.kr)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