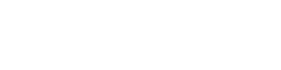영화 속 감사 - 알라딘(Aladdin, 2019)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보고 나서는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두 젊은이가 하는 말이 들려왔다. “알라딘 볼걸. 넘 후회된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뻔한 고전 스토리일 텐데. 요즘 청춘들하고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을 텐데.’
그러자마자 내 청춘 시절이 슬쩍 펼쳐졌다.
담배 연기 가득한 방에서 소설이 써지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알라딘 게임을 열었다. 왕자가 되어 공주를 구하기 위해 칼을 들고 이런저런 적들과 칼싸움을 하다 보면 날이 밝아오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게임을 접고 소설에 몰입해야 한다고 후회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위안을 삼기도 했다.
‘전형적이지만 가장 큰 감동이 있는 이 영웅 스토리 패턴을 익혀두어야 한다. 그래야 베스트 소설을 쓸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후 알라딘은 내게서 멀어져 있었고, 그것은 영화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방송과 언론이 연일 영화 ‘알라딘’을 보도하는 것이었다. 천만 관객 돌파 때문이었다. 호기심이 당겼다.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사회 문화 트렌드를 알려면 천만 영화는 봐두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극장을 찾아들어갔다.
영화 초입 부분에서 아차 싶었다. 바로 후회가 찾아왔다. 선호하지 않는 뮤지컬 영화였기 때문이었다. 중요 부분에서 노래를 부르며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데 와닿지 않아 애먹었다.
이야기도 역시 뻔해 보였다. 분명 좀도둑인데 갑자기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느닷없이 만난 사람이 공주라는 것도 유치하기 그지없었다. 그 장면을 아주 빠르고 경쾌하게 그리고 있었는데, 그 좀도둑 때문에 다친 경찰들은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
현실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이야기에 심드렁해하고 있는데, 기이하게도 그 모습들이 시간이 갈수록 나를 영화에 빨려들게 했다. 도대체 무엇이 그랬을까? 내 청춘 시절의 우울한 기억들을 슬프고도 아름답고도 밝은 음악으로 끌어내고는 그걸 살살 녹여버려서 그랬을까? 아님 그동안 무거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여러 압박감들이 전혀 틈입하지 않고 그저 밝고 명랑해서 그랬을까? 아마 후자였던 것 같다.
영화 ‘알라딘’ 속 스크린에 펼쳐지는 사건들은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지만, 아주 잘, 그것도 권선징악으로, 그래서 행복하게 마무리될 거라는 안심 때문에 한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았다는 것이다.
잠시라도 즐거움과 평온을 준 ‘알라딘’에 감사한다.
소중한 글입니다.
"좋아요" 이모티콘 또는 1감사 댓글 달기
칭찬.지지.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